
출애굽기 5:1~9절
출애굽기는 두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하나님의 자기계시의 과정입니다.
바로왕에게, 이스라엘백성에게, 이스라엘 후손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바로와 이스라엘백성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의 소유물과 같은 노예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모세는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왕 앞에 섰을 겁니다.
모세는 바로를 움직일 힘과 무기도 없었습니다.
1절- 모세는 바로에게 ㅡ하나님께 예배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정합니다.
바로의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2절-여호와가 누구냐? 왜 믿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 말에 반응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당연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바로왕은 감독들에게 조치를 내립니다.
벽돌의 수요는 그대로 하고 짚은 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가 이같이 명령을 내린 이유는 대중이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는 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역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상황이 악화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모세가 나타난 것으로 인해 지금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불만과 원망이 마음이 생기면 표적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불만의 화살이 향해야 합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면 바로에게 향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바로의 부당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들이 고생을 하게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이 정상으로 진행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이스라엘백성은 바로에게 저 자세로 15~16절을 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백성은 자신을 바로에게 당신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더욱 바로에게 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폭정이 가중되니까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잃어버린 자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17절-바로의 대답입니다.
너희들이 게을러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한가한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
이스라엘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발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1절-결국 이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화살을 돌려서 분을 쏟아내게 됩니다. 대중들의 속성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깨어나지 못한 정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용)
이스라엘백성으로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군은 모세이고 적군은 바로입니다.
어려움이 지속되면 아군과 적군이 혼란스러워 집니다.
사탄은 혼돈하게 해서 원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군과 적군이 바뀌는 것을 보여 줍니다.
바로에게 가서 엎드리고, 자신들을 힘들게 했다고 생각해서 모세를 적군으로 여깁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처음에는 감사하고 구원이 이뤄질 날들을 바라보며 기뻐했는데, 더 어려운 자리로 내 몰리게 되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욕을 먹게 됩니다.
모세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가 주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바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힘이 없는 목자인 모세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동역자와 기도의 후원자도 보내주시지만 하나님의 일인 줄 모르는 익숙한 자리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욕먹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결과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따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완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믿음의 말을 할 때 (0) | 2022.03.21 |
|---|---|
| 흔들리는 모세 (0) | 2022.03.10 |
| 모세의 핑계 (0) | 2022.02.24 |
| 술어를 사용하지 않은 하나님 이름 (0) | 2022.02.16 |
| 떨기나무 가운데 (0) | 2022.01.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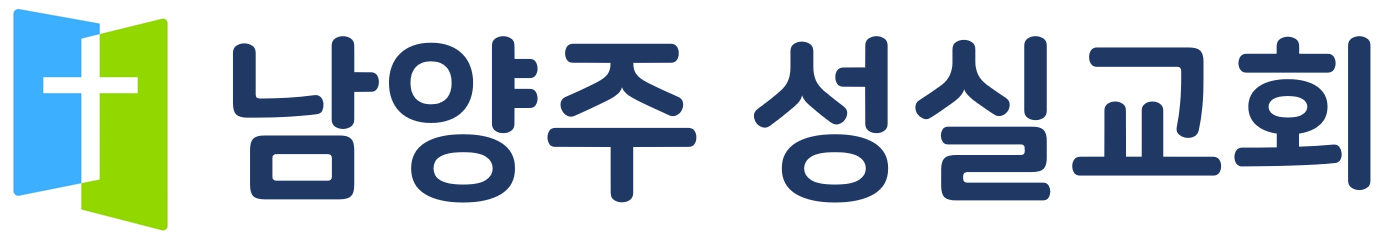




댓글